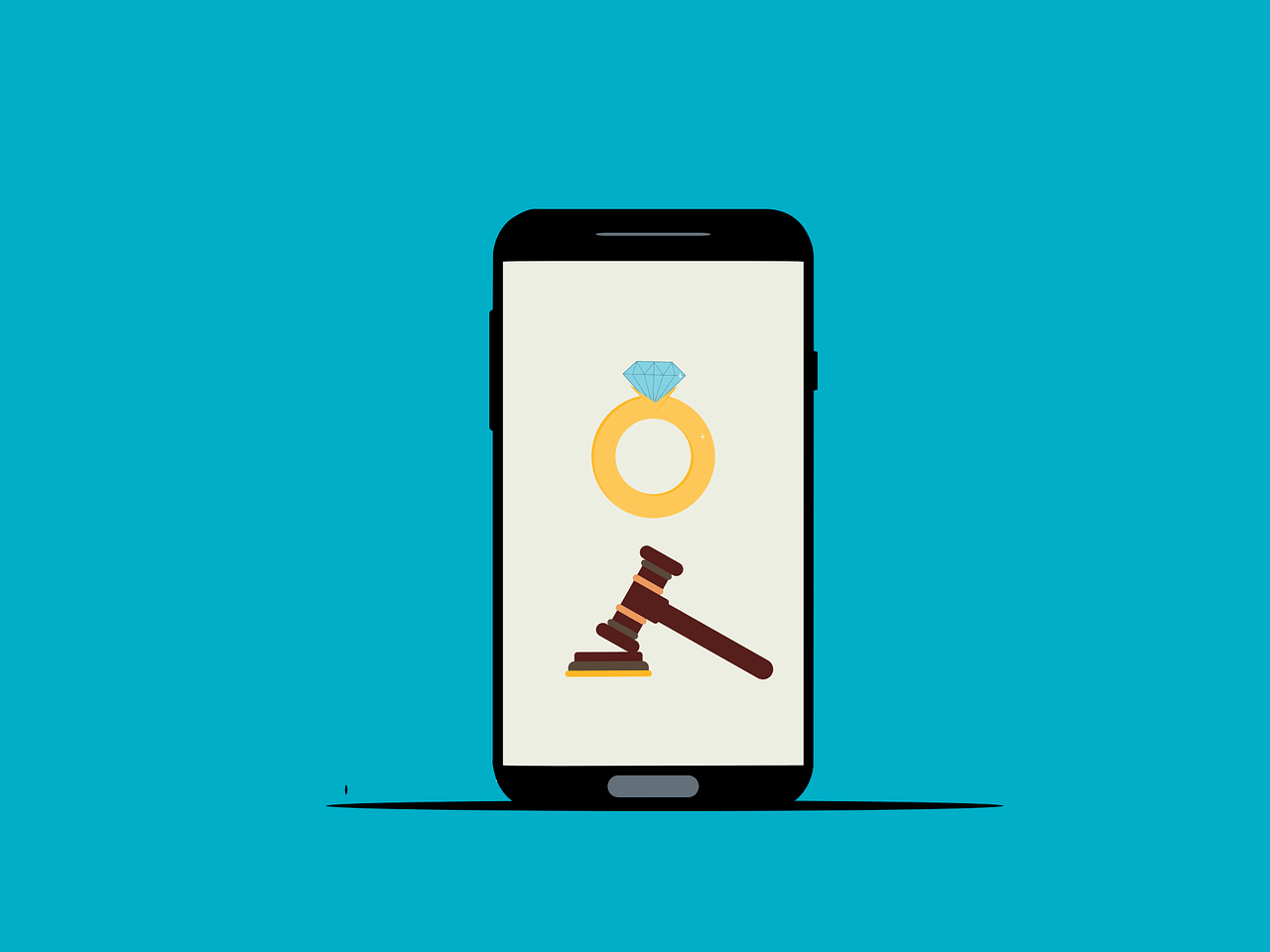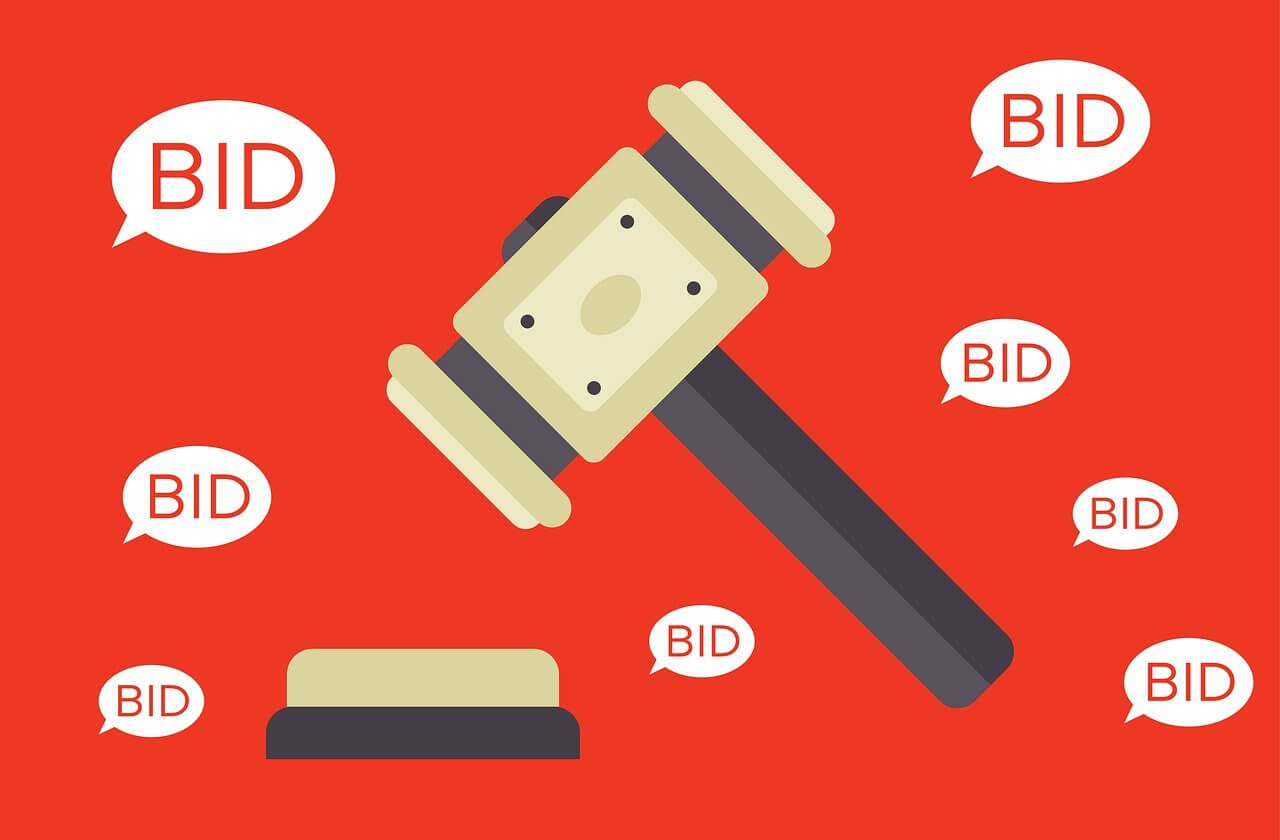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인 지 불과 보름 만에,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낙찰가율 102.3%” —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리는 ‘역전 현상’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시장의 반등 신호가 아니라, 정책 틈새를 노린 자금 이동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 핵심 요약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2.3%, 3년4개월 만의 최고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경매시장으로 갭투자 자금 이동
- 광진·성동 등 한강벨트 낙찰가율 130% 돌파
- 분당·하남·안양 등 경기 핵심지도 동반 과열
- 일반 매매 거래는 급감, 경매시장만 활황
- 단기 반등 후 중기 조정 가능성, 정책 신뢰 회복이 관건
■ 왜 경매로 몰리는가? — ‘토허규제’가 만든 틈새
이번 상승의 배경은 명확하다. 10·15 대책으로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일반 매매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와 대출 제한이 생겼다. 그러나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은 예외다. 관청의 별도 허가 없이 매입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고, 낙찰가가 낮으면 대출 없이 갭투자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장은 규제가 아닌 ‘회피 수단’을 찾기 시작했고, 그 출구가 바로 경매였다. 특히 감정가가 올해 상반기 시세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가 많아 “감정가가 오히려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경쟁률이 치솟았다.
■ 실제 사례: 광진·성동의 낙찰가율 130% 돌파
서울의 상징적 사례는 광진구 청구아파트다. 전용 60㎡가 감정가 10억1천만원에서 14억1천만원(139.7%)에 낙찰됐다. 무려 27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같은 날 자양동 현대6차(130.8%), 성동구 금호동한신휴플러스(130.8%)도 모두 첫 회차에서 낙찰됐다. 이는 경매 시장이 이미 ‘실수요자 중심 시장’이 아닌 ‘투자시장’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대부분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를 활용한 갭투자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토허규제 때문에 일반 매매로 전세 끼고 매입할 수 없게 되자, “경매는 규제의 빈틈”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 수도권 12개 지역도 낙찰가율 급등
이 흐름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주요 도시로 번지고 있다. 과천, 성남, 분당, 수원, 하남 등 12개 규제지역의 10월 평균 낙찰가율은 97.9%로, 전달(94.4%) 대비 상승했다. 특히 분당 105.6%, 하남 102.9%, 안양 102.3% 등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감정가를 넘어섰다.
즉, 규제 강화가 오히려 ‘경매시장 풍선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6·17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자금이 이동하던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 시장의 두 얼굴: 거래절벽과 경매 과열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발표 후 급감했다. 일반 매매시장은 10월 중순 이후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경매시장만은 활황이다. 이런 현상은 시장 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하이리스크-하이리턴 구조를 감수할 수 있는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이 ‘정책 리스크’를 기회로 삼아 움직이고 있는 반면,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는 여전히 관망 중이다. 결국 이번 상승은 “실수요 반등이 아닌 투자형 반등”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 그러나, 경매가 시장의 진짜 온도계는 아니다
경매 낙찰가율이 100%를 돌파했다고 해서 곧바로 ‘집값 상승세’가 시작된다고 보긴 어렵다. 경매는 전체 거래의 2~3%에 불과하며, 감정가 자체가 시장 시세보다 뒤늦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낙찰가율 상승은 심리적 기대감의 반영이지, 실제 시장 반전의 증거는 아니다.
또한 경매 특성상 ‘대출이 어려운 고가 현금 낙찰’이 많기 때문에, 이는 시장의 전반적 회복이라기보다 일부 자산가들의 투자 재진입 신호에 가깝다.
■ 앞으로의 전망: 단기 반등, 중기 조정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단기 유동성 반응에 가깝다고 본다. 현재 매매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로 인해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시장 유동성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경매 과열은 일시적 반등 국면으로, “규제가 아닌 심리가 움직이는 장세”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지지옥션 이주현 연구위원도 “토허구역 확대로 외곽과 중심이 초양극화될 것”이라며 “매매가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면 고가 낙찰자들의 손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결론 – ‘규제의 풍선효과’, 이번에도 반복된다
서울 경매시장의 과열은 단순히 투자자들의 탐욕이 아니다. 정책이 만들어낸 ‘시장 왜곡’의 부산물이다. 토허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지만, 현실에선 다시 갭투자라는 이름의 편법 시장을 키우고 있다.
2020년, 서울을 막으니 수원이 들썩였고, 2021년엔 대전과 울산이, 이제는 2025년의 서울을 막자 부산과 경매시장이 들썩인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규제의 확장’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책 신뢰’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그들은 언제나 다른 출구를 찾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규제가 풍선이라면, 시장은 바람처럼 흘러간다.”
이번 서울 경매 과열이 바로 그 증거다.